이런 모임이 있어. 일년에 서너 번 정도 의미가 있는 날에는 장소를 빌려서 모이기도 하는데, 주로 온라인에서 영상 미팅으로 만나. 사실 영상이 필요하지 않은 모임이기도 해. 모여서 ‘연설’을 낭독하니까 굳이 얼굴을 안 보고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하지.
세계사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연설들이 있잖아. 명연설로 유명한 인물들도 많고. 그래서 주제나 역사적 시기를 하나 정하면 각자 선택한 연설을 돌아가며 낭독한 후에, 그런 톤이나 느낌으로 낭독한 의도, 배경, 근거 등을 설명하는 거야.
예를 들어, 펠로폰네소스전쟁 당시 페리클레스의 ‘장례식 추도연설’을 낭독하는 거지. 일부만 인용해보면,
… 이분들 중 어떤 분도 부의 즐거움을 계속 누리고자 유약해지지 않으셨고, 언젠가는 그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해지리라는 희망으로 두려운 일을 미뤄 두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적들에 대한 복수를 더 갈망하며, 위험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것을 고귀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위험을 안고서도 그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셨고, 다른 일들은 포기하셨습니다. 그들은 성공의 불확실함은 희망에 맡기고 당장의 일은 자신들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맞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복해서 살아남는 것보다는 저항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치욕적인 말은 피하고 현실은 몸으로 견뎠고, 운명의 순간에 두려움이 아닌 영광의 절정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1 …
학생이 국어책 읽듯 또박또박 읽을 수도 있고, 감정은 배제한 채로 무미건조하게 읽을 수도 있고, 당시 페리클레스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비장하게 또는 선동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현대 정치가들이 연설할 때와 같은 느낌으로 읽을 수도 있는 거야. 단,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그런 톤을 선택해서 낭독했는지 그 의도를 설명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냥’만 아니면 돼.
이렇게 남의 연설을 자기 목소리로 소리 내서 읽다보면 그 연설자에 몰입하는 경우가 생기더라. 연기라고는 초등학생 때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요셉’ 역할이었던가) 밖에는 해본 적이 없는 데도 말이지. 말로 한 연설을 글로 옮긴 것이고, 게다가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니 실제 연설과는 많이 다를거야. 그렇지만 연설의 대상이 분명하고, 극적인 구조가 있고, 의도하는 효과가 있다보니 몰입이 잘 되는 것 같아.
가끔 원문을 입에 잘 붙도록 수정해서 읽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어떤 분은 너무 몰입해서 낭독을 하다가 사투리가 불쑥 튀어나와서 참여자들이 웃음을 참느라고 힘들었던 기억도 있어. 나중에 물어보니 본인의 고향 사투리도 아니었던 것으로. 자기도 모르게 혀가 그렇게 움직였다나.
가끔 있는 오프라인 모임은, 저녁에 카페 같은 곳을 빌려서 하곤 해. 실제 연설이라면 연단 같은 것도 있을 테니 옛날 ‘웅변’ 대회나 선거 유세처럼 학교 강당이나 운동장 같은 곳을 빌려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좀 힘드니까. 또 이건 시(詩) 낭송회가 아니니 분위기 있는 어두운 조명보다는 최대한 밝게 만들고 해.
얘길 들어보면, 연설을 잘 하고 싶거나 그래서 모임에 참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말을 위해 쓴 글을 (주로 비대면이긴 하지만) 여럿 앞에서 읽는다는 경험도 새롭고, 다른 사람이 나름대로 상황을 해석해서 읽는 것을 듣는 재미도 있고, 여기 아니면 이런 이상한 짓을 해볼 곳이 별로 없어서인 것도 같아.
한국어로 번역된 명연설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이 모임을 얼마나 오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갔으면 좋겠다.
※ 이 글은 픽션입니다.《그리스의 위대한 연설》, 이소크라테스 외(지음), 김헌 외(옮김), 민음사, 2015. pp.4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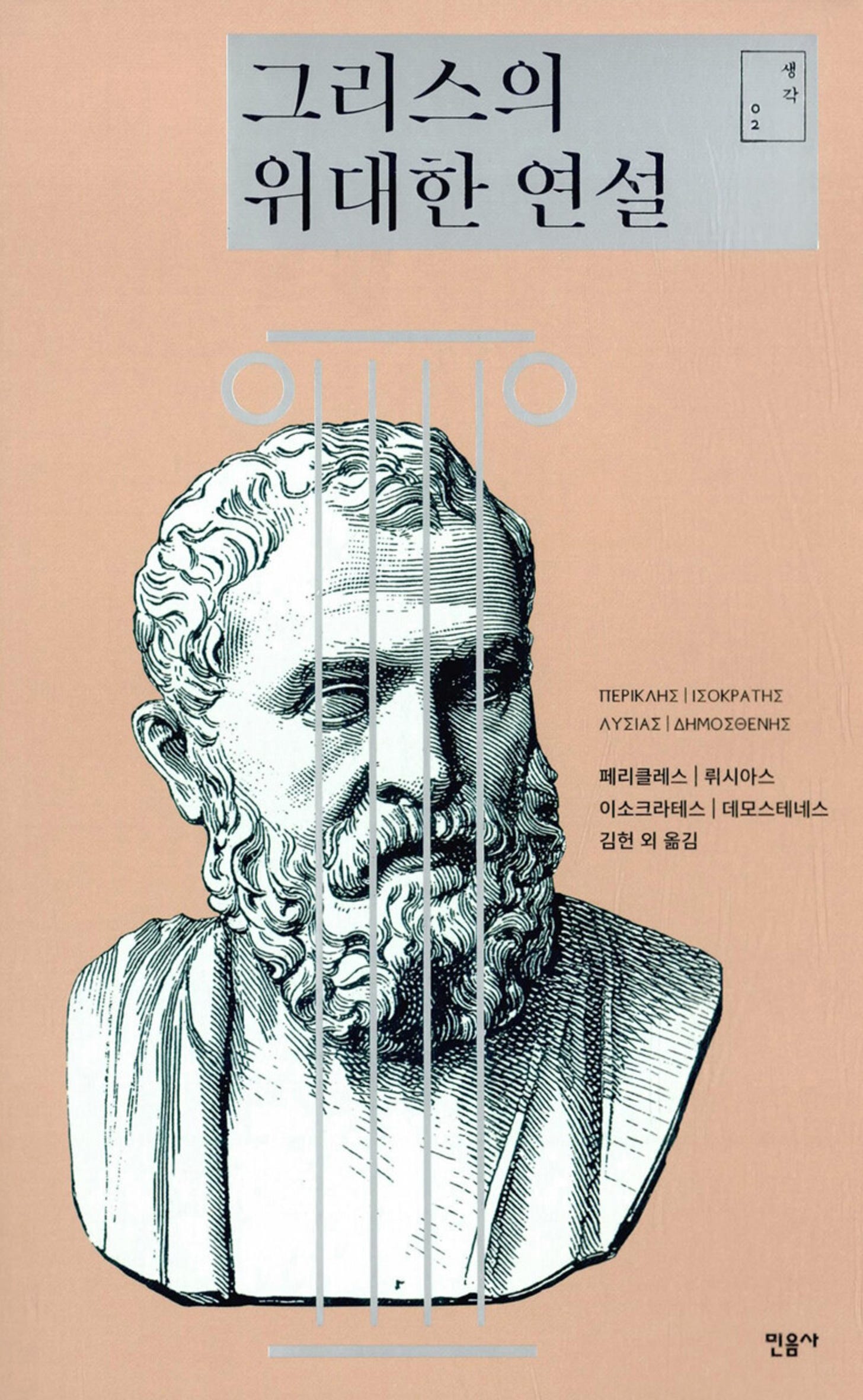
대단히 혹한다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픽션이었네요. 장사하셔도 되겠어요ㅋㅋㅋ
예전에 장 그르니에의 섬을 파트별로 낭독하고 녹음했던 적이 있었는데, 재미있었어요.
혼자 책을 읽고 녹음하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있는데 매우 귀찮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