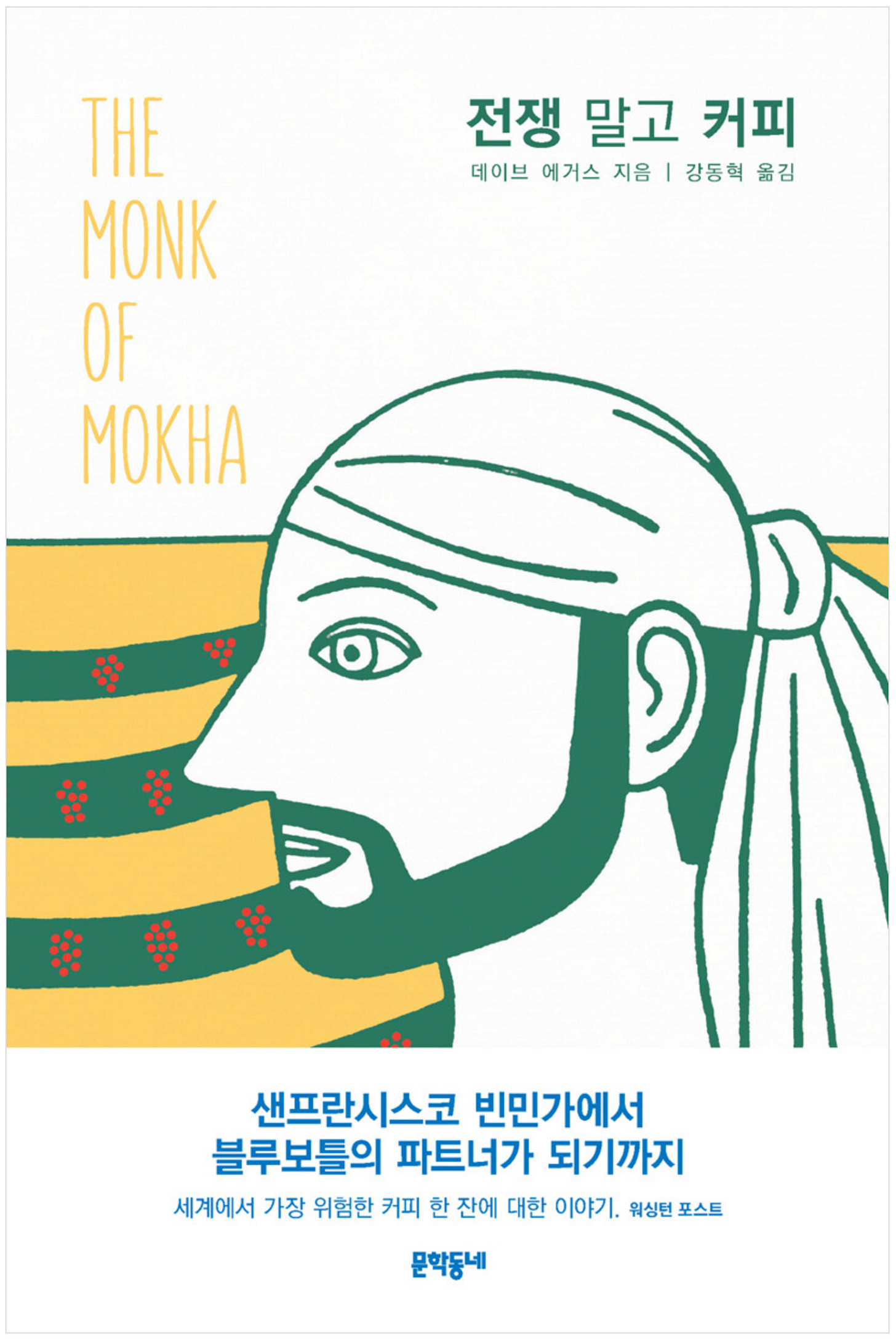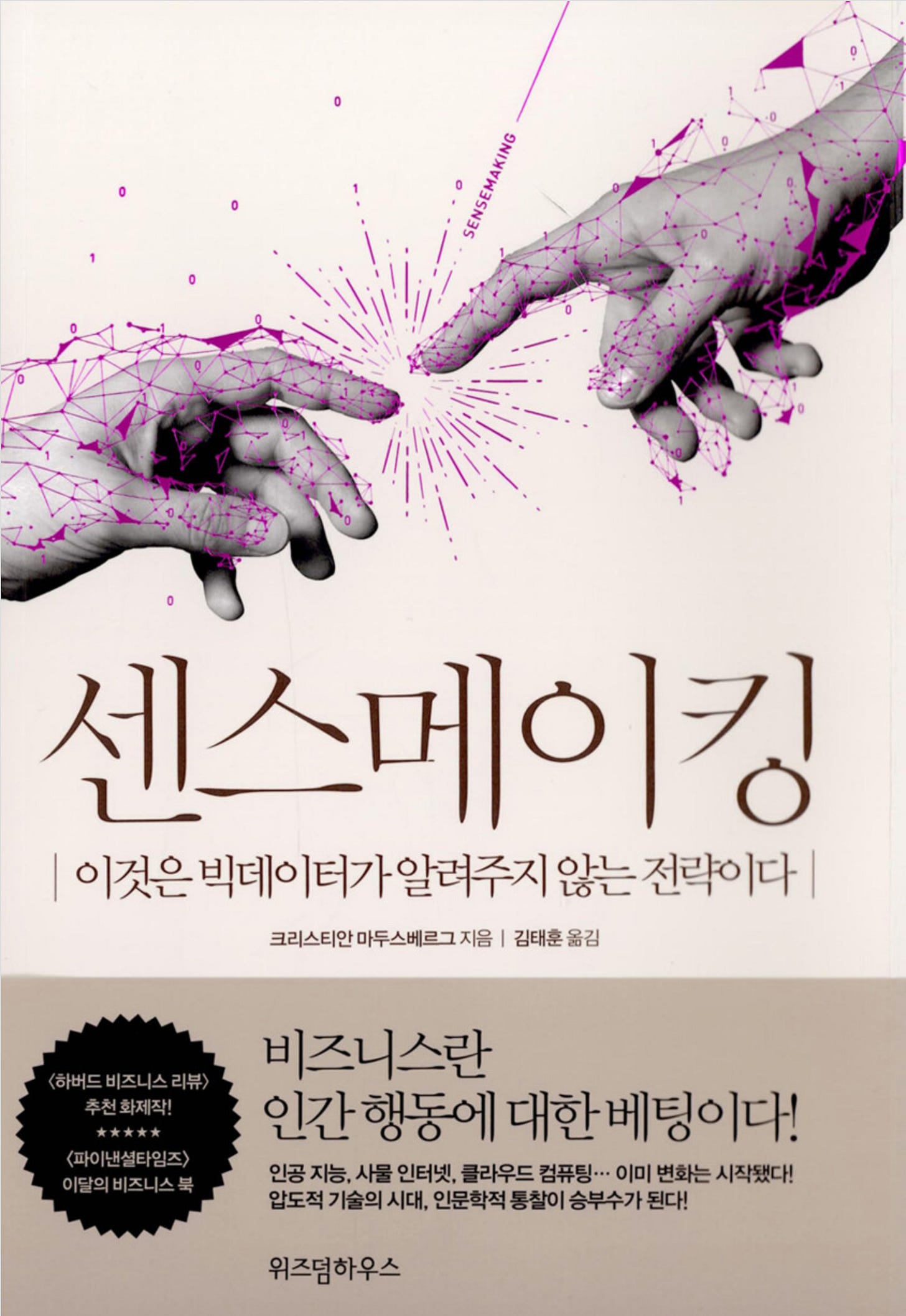#243 책 몇 권
문구, 논픽션, 센스메이킹, NFT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책부터 찾는 습관이 있어. 인터넷을 쓰기 시작한 후에도 말이지. 책이 필요할까 싶은 취미, 예를 들어 테니스, 농구, 무술 등과 같은 운동에 대한 책도 샀었지. 책을, 모든 것을 시작하는 기본, 원점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모든 것은 아니지만 꼭 있어야 할 것은 담겨 있는 것.
내 이런 면이 혹시 현실에 바로 뛰어들어 부딪히기보다는 중간에 책이라는 완충재를 두고 싶어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 신중하거나 소심하거나. 지적 갈망과 동시에 지적 허영도 함께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 그냥 계속 이렇게 사는 거지. 난 이게 좋다? (극복.)
그래서 어제 문구에 대한 책들이 뭐가 있나 좀 훑어보고 엄선해서 주문했어. 이제는 관심 있는 주제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사서 쟁여놓지 않는다고. 신간들은 아니지만 문구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팁들을 정리한 실용서와 일본 학자가 문구를 사용하며 느낀 것들을 풀어놓은 에세이야.
《문구를 매우 쉽게 즐기는 아이디어북》, 미즈타마(지음), 장인주(옮김), 미디어샘, 2020.
《사랑하는 나의 문방구》, 구시다 마고이치(지음), 심정명(옮김), 정은문고, 2017.
데이브 에거스의 책은 완독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계속 끌리는 작가야. 우연히 발견한 책인데 매우 ‘아메리칸 드림’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논픽션이라는 점, 애호하는 커피를 둘러싼 얘기라는 점, 자신을 옥죄고 있는 현실을 깨고 나가는 주인공이 있다는 점이 이 책을 사게 만들었어.
《전쟁 말고 커피》, 데이브 에거스(지음), 강동혁(옮김), 문학동네. 2019.
며칠 전 239호에서 ‘커네빈 프레임워크’를 설명한 내용 중 “감각적인 프레임워크다”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이 ‘감각적인’이라는 단어가 전체 맥락에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예전에 샀던 영어판 전자책을 보니 ‘sense-making’의 번역이더라고. 그냥 ‘이해하다’(make sense)를 활용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용어는 아니겠지 싶었는데, 그래도 뭔가 찜찜해서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배경이 있는 용어였네. 일단 영어사전에는 “사람들이 집단적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프로세스”(네이버 영어사전)라고 나와있고, 위키피디아에도 ‘Sensemaking’ 항목이 있어. 그리고 예전에 내가 《센스메이킹》이란 책을 샀던 기억이 났네. 이땐 아마 빅데이터와의 연관성 때문에 샀던 걸로 기억해.
《센스메이킹》, 크리스티안 마두스베르그(지음), 김태훈(옮김), 위즈덤하우스, 2017.
마지막으로, 요즘 눈만 돌리면 보이는 NFT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책을 하나 골랐어. 유행에 편승해 급조한 듯한 책은 정말 혐오하는데, 그나마 기본 내용을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은 얇은 책을 하나 골랐어. 구독중인 〈북저널리즘〉에서도 NTF에 대해 계속 다루고 있어서 그것과 병행해, 이게 뭐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좀 알고 싶네.
《NFT 사용설명서》, 맷 포트나우 · 큐해리슨 테리(지음), 남경보(옮김), 여의도책방,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