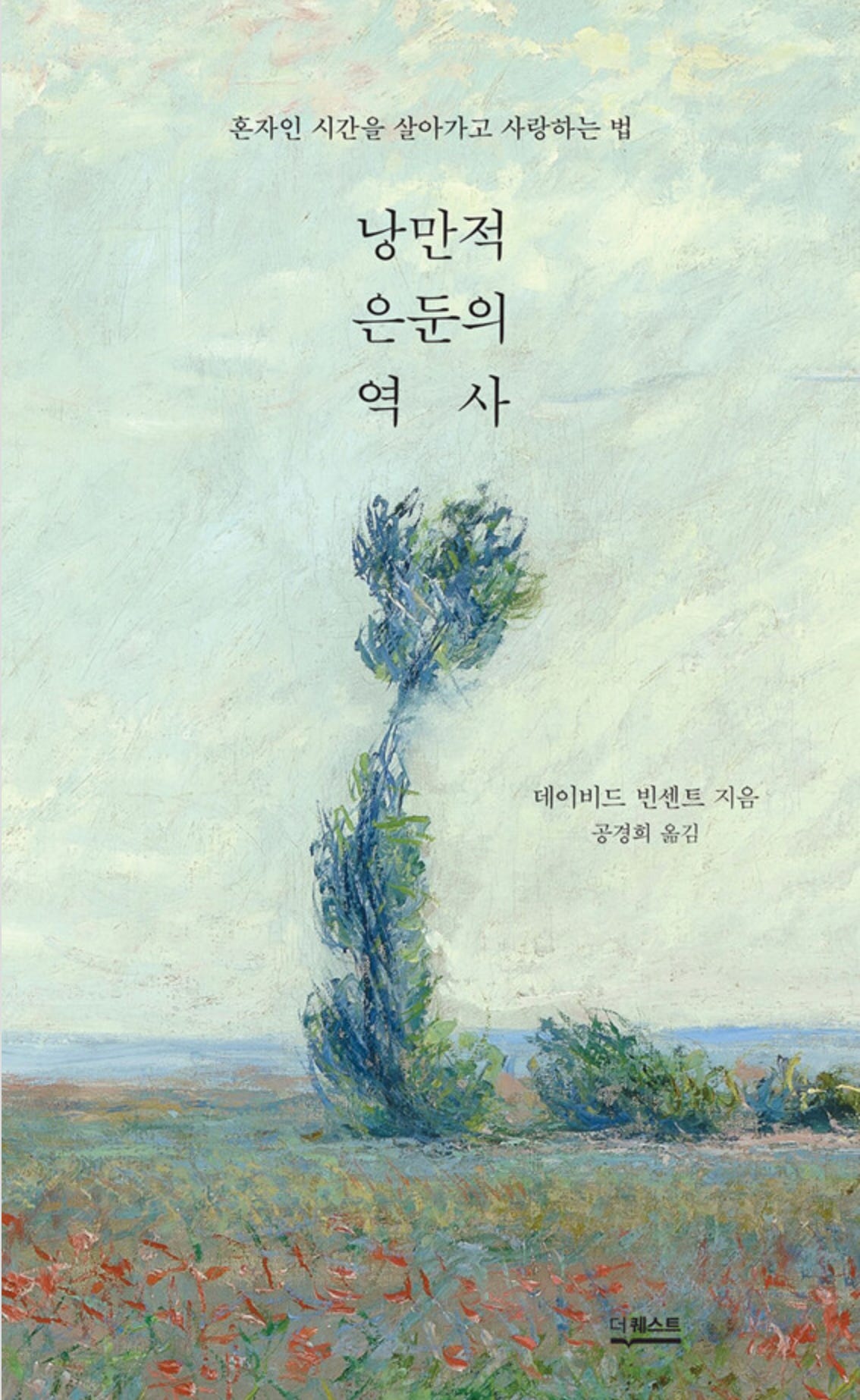이 책은 선생님께서 《기나긴 혁명》과 함께 언급하신 테리 이글턴의 서평에 나온 책이지요. 제가 생명수처럼 여기는 “혼자인 시간”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정리해놨는지, 왜 “낭만적”인 것인지 궁금했어요(책의 원제는 “A History of Solitude”입니다).
“역사적”이라고는 하지만 영국의 역사이고, 내용 중간중간에 ‘낭만주의 운동’이 언급되긴 하는데, 제가 아는 초기 낭만주의와는 많이 다른, ‘후기 낭만주의’를 가리키는 것 아닌가 싶군요. 과연 이 책의 제목이 정당한지는 마지막 편에서 판단하겠습니다.
《낭만적 은둔의 역사: 혼자인 시간을 살아가고 사랑하는 법》, 데이비드 빈센트(지음), 공경희(옮김), 더퀘스트, 2022
이번에도 지식정원에,
서장: 혼자 있는 시간을 생각한 사람들
1장: 고독, 나 그대와 거닐리 — '산책'에 관하여
2장: 19세기 나 홀로 집에 — '여가활동'에 관하여
을 정리해놨어요. 이전과 조금 다른 점은, 정리하며 든 제 생각을 함께 적어놨다는 거에요. 이렇게요.
보행자들은 점점 서로만이 아니라 지나는 동네와도 분리됨 (💡현재의 네비게이션이 미친 영향도 생각해 볼 필요. 이동의 과정이 아닌 결과만 있음. 여행의 경우, 해당 지역과 분리되고 목적지만 남음.)
괄호 안에 💡를 붙이고 넣어놨어요. 나중에 찾기 쉽게. 생각날 때 빨리 적어놔야지, 안 그러면 전혀 기억도 안 나니까. 그래도 내 머리 속을 너무 다 공개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영국이란 나라는 신분 질서가 참 분명했(하)구나라는 것도 느꼈는데, 참고삼아 《기나긴 혁명》에서 제시한 “여덟 가지의 비교적 지속적인 가족 형태”(p.296)를 확인해 봤어요.
귀족
젠트리
전문직
도매상
소매상
농부
장인
노동자
그리고, 영국이 세계에 미친 영향도 크다는 걸 느꼈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익숙한 — 산책에 대한 찬미, 정원과 원예에 대한 갈망, 반려동물, 특히 개의 품종 개량, 순종에 대한 선호 등등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게 언제 어딜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들어왔는지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네요.
또한 이 식민주의자였던 영국인들의 아곤, 즉 승패를 가리는 경쟁에 대한 집착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산책 또는 도보를 하면서 누가 더 빨리 많이 걸었는지를 가지고도 경쟁을 하며 우쭐댔다니 거참 적당히 좀 하지. 버지니아 울프가 그런 아버지 슬하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고나니 뭔가 알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작가이자 버지니아 울프의 아버지인 레슬리 스티븐은 알파인 클럽의 만찬을 위해 케임브리지에서 런던까지 12시간에 주파해내며 속도와 안락함을 초월한 신체적 역량을 증명했다. (p.56)
(계속)